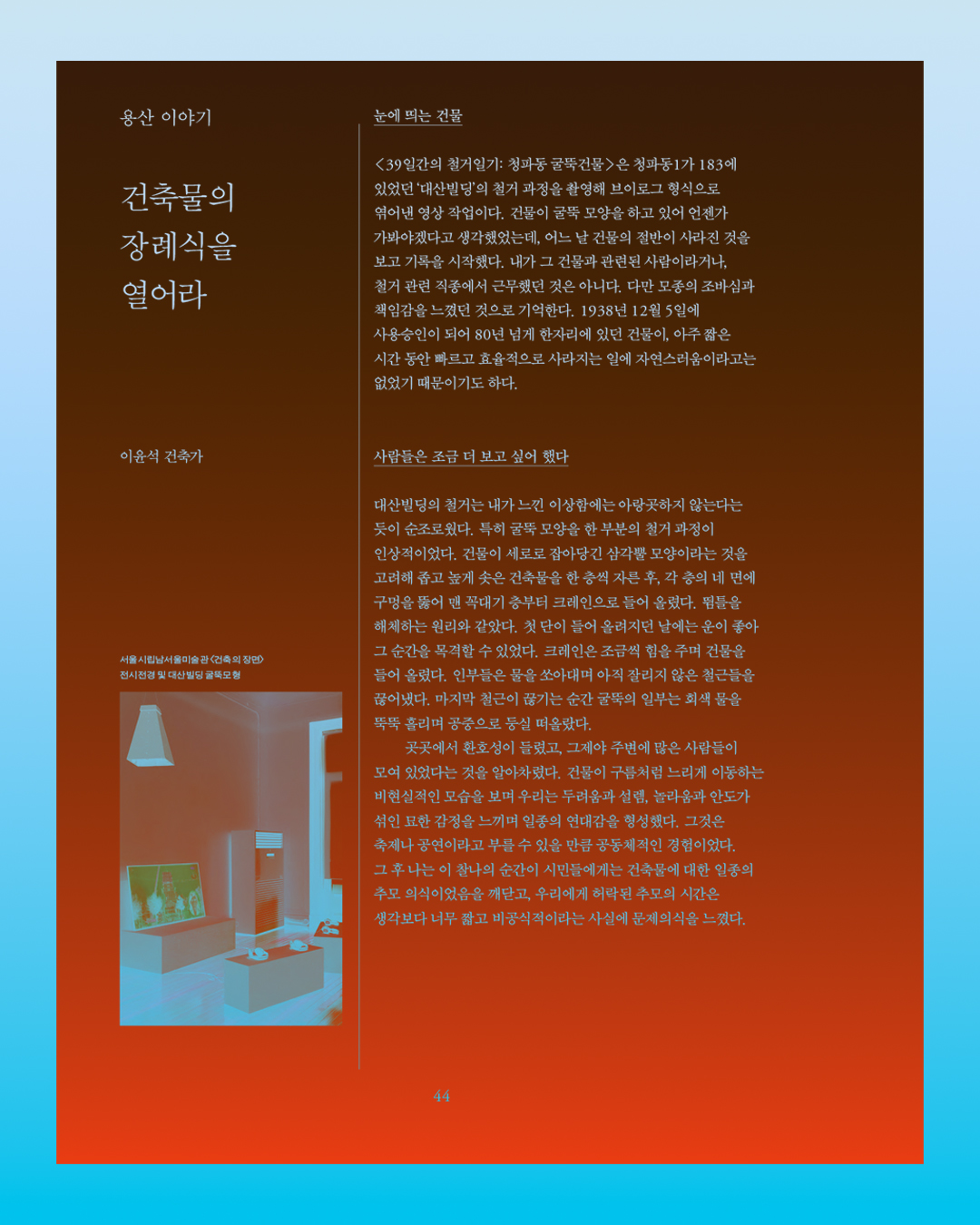title 건축물의 장례식을 열어라
year 2025 여름호
publish YOHIM (용산역사박물관)
year 2025 여름호
publish YOHIM (용산역사박물관)
눈에 띄는 건물
<39일간의 철거일기: 청파동 굴뚝건물>은 청파동1가 183에 있었던 ‘대산빌딩’의 철거 과정을 촬영해 브이로그 형식으로 엮어낸 영상 작업이다. 건물이 굴뚝 모양을 하고 있어 언젠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건물의 절반이 사라진 것을 보고 기록을 시작했다. 내가 그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라거나, 철거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모종의 조바심과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38년 12월 5일에 사용승인이 되어 80년 넘게 한자리에 있던 건물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라지는 일에 자연스러움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조금 더 보고싶어했다
대산빌딩의 철거는 내가 느낀 이상함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순조로웠다. 특히 굴뚝 모양을 한 부분의 철거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건물이 세로로 잡아당긴 삼각뿔 모양이라는 것을 고려해 좁고 높게 솟은 건축물을 한 층씩 자른 후, 각 층의 네 면에 구멍을 뚫어 맨 꼭대기 층부터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다. 뜀틀을 해체하는 원리와 같았다. 첫 단이 들어 올려지던 날에는 운이 좋아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크레인은 조금씩 힘을 주며 건물을 들어올렸다. 인부들은 물을 쏘아대며 아직 잘리지 않은 철근들을 끊어냈다. 마지막 철근이 끊기는 순간 굴뚝의 일부는 회색 물을 뚝뚝 흘리며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렸고, 그제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건물이 구름처럼 느리게 이동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과 설렘,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했다. 그것은 축제나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공동체적인 경험이었다. 그 후 나는 이 찰나의 순간이 시민들에게는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추모 의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추모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짧고 비공식적이라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깨진 창으로 드나드는 것
사실 철거의 시간은 건축물과 도시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이러한 '과정의', 혹은 '중간적' 상태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멀어지며 임의로 부여된 기능을 벗어버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스스로 숨쉬기 시작할 때, 공간은 도시를 품으며 제 몸을 되찾는다. 대산빌딩의 철거 과정을 기록하며 목격한 많은 순간들이 그것을 증거했다. 내부 공간을 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날,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건물의 3층에는 벗어놓은 몇 켤레의 신발과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있었다. 깜짝 놀라 급히 그곳을 빠져나온 탓에 나는 그 목소리들이 공사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철거 노동자의 것이었는지, 거처를 찾아 건물로 들어온 노숙인들의 것이었는지 평생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느 날은 사진 가방을 든 채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을 멀리서 목격했다. 아마 나처럼 대산빌딩이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온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이 종종 내 타임라인에 넘어오기도 했다. 내가 설계했던 프로젝트 중 철거를 앞두고 있던 어떤 폐공장에는 누군가 석고보드와 각목으로 전시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전기를 끌어와 미술작품을 전시해 놓았던 적도 있었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미술작품을 수거해갔는지 까지는 추적하지 않았다. 때때로 철거 직전의 건물은 원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티스케이프(@cityscape_360) 님의 트윗을 통해 영업을 종료한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이 지역 소방서의 소방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건축물이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도 상상하지 못했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짜릿했다.
포용하는 벽과 지붕
우리는 건축물의 시간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건물은 그것의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살아나, 사람들이 떠날 때 죽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생명력이 가장 강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죽어간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다. 철거를 앞둔 건축물에는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 모여든다. 기능이 무의미해진 공간 안팎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 안전한 쉴 곳을 찾아 떠도는 비인간들, 그리고 그 장소와 얽힌 개인적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스며든다. 이들은 도시가 제도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타자이거나, 도시가 무시하기 쉬운 비물질적 가치를 따라 이곳에 도달한 자들이다. 소멸할 건축물이 잠시동안 '과정의 공간'으로 방치되는 순간, 도시가 배제해 온 존재들이 그곳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주목하는 일은 단순한 감상적 애도 행위가 아닌, 도시에서 무엇이 지워져 왔었는지를 마주할 기회다. 따라서 죽어가는 건축물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일은 도시의 포용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최근 청파동에 오픈한 카페 '킷테(청파동 주택)'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본인이 지은 한반도 화양절충식1 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1930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대산빌딩(1938년 준공)에 애정을 가진 나로서는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이곳을 리모델링한 건축가는 기록가를 비롯한 동료들과 협력해 건축물을 이해하고, 기록하고, 가꾸는 일을 통해 건물의 명예로운 죽음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죽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킷테'보다 나중에 지어졌지만 더 빨리 사라진 대산빌딩은 어떤 방식으로 기려질 수 있었는가를 잠시 상상해보았다.
열린-죽음-잔치
건축물의 장례식을 열자. 부고를 알리고, 요란한 축제를 벌이자. 건축물의 준공을 축하하며 오픈하우스(open house)를 열듯, 사라짐을 기념하는 클로징하우스(closing house)를 열어 도시의 생로병사를 공적인 경험으로 만들자. 누구는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틀고, 어떤 이들은 하룻밤 자고 가거나, 시를 낭독할 수도 있는 열린-죽음-잔치이다. 건축물의 탄생만을 설계해 온 건축가의 역할은 이 축제를 통해 건축물을 위한 장의사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 사회는 죽음이나 과정 따위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생명이 다했다고 선고된 공간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워지고, 새로운 '짓기'로 덮여버릴 뿐이다. 이 경험을 위한 시간도, 형식도, 제도도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도시는 끊김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도시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1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을 뜻한다 (<나이층 1930~2024: 청파동 주택 리모델링 기록>, 공간서가)
<39일간의 철거일기: 청파동 굴뚝건물>은 청파동1가 183에 있었던 ‘대산빌딩’의 철거 과정을 촬영해 브이로그 형식으로 엮어낸 영상 작업이다. 건물이 굴뚝 모양을 하고 있어 언젠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건물의 절반이 사라진 것을 보고 기록을 시작했다. 내가 그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라거나, 철거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모종의 조바심과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38년 12월 5일에 사용승인이 되어 80년 넘게 한자리에 있던 건물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라지는 일에 자연스러움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조금 더 보고싶어했다
대산빌딩의 철거는 내가 느낀 이상함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순조로웠다. 특히 굴뚝 모양을 한 부분의 철거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건물이 세로로 잡아당긴 삼각뿔 모양이라는 것을 고려해 좁고 높게 솟은 건축물을 한 층씩 자른 후, 각 층의 네 면에 구멍을 뚫어 맨 꼭대기 층부터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다. 뜀틀을 해체하는 원리와 같았다. 첫 단이 들어 올려지던 날에는 운이 좋아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크레인은 조금씩 힘을 주며 건물을 들어올렸다. 인부들은 물을 쏘아대며 아직 잘리지 않은 철근들을 끊어냈다. 마지막 철근이 끊기는 순간 굴뚝의 일부는 회색 물을 뚝뚝 흘리며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렸고, 그제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건물이 구름처럼 느리게 이동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과 설렘,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했다. 그것은 축제나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공동체적인 경험이었다. 그 후 나는 이 찰나의 순간이 시민들에게는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추모 의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추모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짧고 비공식적이라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깨진 창으로 드나드는 것
사실 철거의 시간은 건축물과 도시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이러한 '과정의', 혹은 '중간적' 상태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멀어지며 임의로 부여된 기능을 벗어버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스스로 숨쉬기 시작할 때, 공간은 도시를 품으며 제 몸을 되찾는다. 대산빌딩의 철거 과정을 기록하며 목격한 많은 순간들이 그것을 증거했다. 내부 공간을 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날,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건물의 3층에는 벗어놓은 몇 켤레의 신발과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있었다. 깜짝 놀라 급히 그곳을 빠져나온 탓에 나는 그 목소리들이 공사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철거 노동자의 것이었는지, 거처를 찾아 건물로 들어온 노숙인들의 것이었는지 평생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느 날은 사진 가방을 든 채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을 멀리서 목격했다. 아마 나처럼 대산빌딩이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온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이 종종 내 타임라인에 넘어오기도 했다. 내가 설계했던 프로젝트 중 철거를 앞두고 있던 어떤 폐공장에는 누군가 석고보드와 각목으로 전시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전기를 끌어와 미술작품을 전시해 놓았던 적도 있었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미술작품을 수거해갔는지 까지는 추적하지 않았다. 때때로 철거 직전의 건물은 원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티스케이프(@cityscape_360) 님의 트윗을 통해 영업을 종료한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이 지역 소방서의 소방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건축물이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도 상상하지 못했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짜릿했다.
포용하는 벽과 지붕
우리는 건축물의 시간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건물은 그것의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살아나, 사람들이 떠날 때 죽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생명력이 가장 강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죽어간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다. 철거를 앞둔 건축물에는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 모여든다. 기능이 무의미해진 공간 안팎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 안전한 쉴 곳을 찾아 떠도는 비인간들, 그리고 그 장소와 얽힌 개인적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스며든다. 이들은 도시가 제도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타자이거나, 도시가 무시하기 쉬운 비물질적 가치를 따라 이곳에 도달한 자들이다. 소멸할 건축물이 잠시동안 '과정의 공간'으로 방치되는 순간, 도시가 배제해 온 존재들이 그곳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주목하는 일은 단순한 감상적 애도 행위가 아닌, 도시에서 무엇이 지워져 왔었는지를 마주할 기회다. 따라서 죽어가는 건축물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일은 도시의 포용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최근 청파동에 오픈한 카페 '킷테(청파동 주택)'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본인이 지은 한반도 화양절충식1 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1930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대산빌딩(1938년 준공)에 애정을 가진 나로서는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이곳을 리모델링한 건축가는 기록가를 비롯한 동료들과 협력해 건축물을 이해하고, 기록하고, 가꾸는 일을 통해 건물의 명예로운 죽음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죽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킷테'보다 나중에 지어졌지만 더 빨리 사라진 대산빌딩은 어떤 방식으로 기려질 수 있었는가를 잠시 상상해보았다.
열린-죽음-잔치
건축물의 장례식을 열자. 부고를 알리고, 요란한 축제를 벌이자. 건축물의 준공을 축하하며 오픈하우스(open house)를 열듯, 사라짐을 기념하는 클로징하우스(closing house)를 열어 도시의 생로병사를 공적인 경험으로 만들자. 누구는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틀고, 어떤 이들은 하룻밤 자고 가거나, 시를 낭독할 수도 있는 열린-죽음-잔치이다. 건축물의 탄생만을 설계해 온 건축가의 역할은 이 축제를 통해 건축물을 위한 장의사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 사회는 죽음이나 과정 따위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생명이 다했다고 선고된 공간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워지고, 새로운 '짓기'로 덮여버릴 뿐이다. 이 경험을 위한 시간도, 형식도, 제도도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도시는 끊김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도시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1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을 뜻한다 (<나이층 1930~2024: 청파동 주택 리모델링 기록>, 공간서가)